글_박재희 작가(「마음공부 명심보감」
저자, 前 POSCO 전략대학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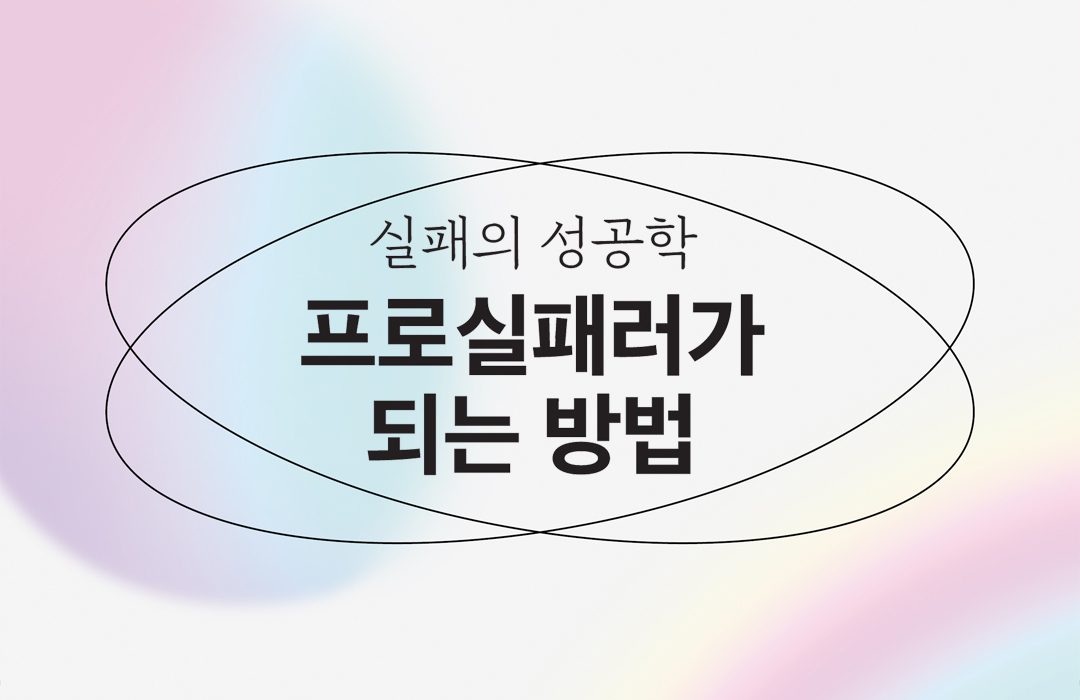
한 해를 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누구보다 자신했던 일에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큰 피해를 본 경험도 있고,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남는다. 지나온 한 해가 모두 성공과 만족에 흡족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음 단계의 높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실패를 통한 더 높은 단계로의 성장을 이루는 ‘프로실패러’의 자세이다. 실패에도 프로의 경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의 삼품(三品)
실패를 겪는 사람에게 세 가지 품격이 있다. 실패했다고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실패의 하품(下品)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산을 만나면 그대로 주저앉아 신세 한탄에 시간을 보내는 포기자(quitter)라고 한다. 그 위 등급은 실패를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실패 속에 안주하며 그냥저냥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실패의 중품(中品)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산을 만나면 산을 올라가나 힘든 깔딱고개를 만나면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위로하며 안주하는 자(camper)라고 한다. 최상의 등급은 실패를 발판삼아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니, 실패의 상품(上品)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험난한 산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극복하는 자(climber)라고 한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G stoltz) 박사는 실패를 이기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climber)들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고 그의 역경 지수, AQ(Adversity Quotient) 이론에서 주장한다. 실패는 인간을 좌절하게 하지만, 견뎌내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실패러’야말로 최종 승리자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패 속에 새로운 길
<맹자(孟子)>는 하늘이 한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실패의 늪에 빠트려 몸과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한다.
일명 ‘대임(大任) 이론’으로 큰(大) 임무(任)를 맡기 전까지 실패의 인턴십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맹자는 정신적 실패, 육체적 실패, 재정적 실패를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단련되고, 그 사람의 잠재된 역량이 요동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쳐야 할 과정이 고(苦), 노(勞), 아(餓)이다. 고(苦)는 마음의 고통이다. 정신적인 아픔과 심리적인 실패를 맛보는 것이다. 노(勞)는 육체적 수고로움이다. 육신과 뼈가 병들고 힘들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건강상의 실패를 겪는 것이다. 아(餓)는 경제적 궁핍이다.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정적 실패다.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 동심(動心), 인성(忍性), 익능(益能)의 세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 동심은 마음을 구동시켜 분발하게 하는 것이고, 인성은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고, 익능은 능력을 더욱 키워내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 성공하고, 실패를 통해 천하의 대임을 수행한다는 유교의 실패와 성공의 상관 이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실패와 역경은 한 사람을 살리는 동력이 되고, 안정과 안락은 오히려 한 사람을 몰락시키는 계기가 된다. ‘생어우환(生於憂患), 사어안락(死於安樂)’ 지금의 우환과 실패가 오히려 삶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지금의 안정과 안락이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맹자(孟子)의 결론이다. 실패를 제대로 겪어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성공을 위한 축복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2,500년간 아시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던 유교 철학의 실패와 성공의 이중주 이론이다. 역대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런 실패의 인턴십을 견뎌 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실패를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실패, 인간의 존재 방식
세상에 아무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출신과 배경이 아무리 좋게 태어났고,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패를 피해갈 수는 없다. 실패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실패를 마주하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실패를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실패에 젖어 무기력하게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실패러는 실패를 빨리 인정한다. 그리고 내 탓이라고 크게 외친다. 하늘을 원망하거나(怨天, 원천) 다른 사람을 탓하지(尤人, 우인) 않는다.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방법을 고치는 일에 주저하지 마라(過則勿憚改, 과즉물탄개).’
공자는 누구나 실패(過)는 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한다. 문제는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고 똑같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방법을 바꾸는 일(改)에 대하여 두려워(憚)해서는 안 된다.
궁즉통(窮則通), 실패의 성공학
우주의 운동방식은 실패(窮)→개선(變)→성공(通)→지속(久)→실패(窮)의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것이 <주역(周易)>의 세계관이다. 요점은 실패를 통해 우주는 변화와 진화를 지속하며, 인간도 이런 변화의 패턴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窮)를 성공(通)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는 변(變)이다. 변화야말로 쓰라린 실패의 고통을 딛고 성공으로 전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성공의 답을 찾아낸다면 <주역>이 인정하는 프로실패러다. 변화는 익숙한 것과 결별이다.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과 과감하게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변통(變通)이다. 변화를 통해 성공의 계기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이다.
심기일전(心機一轉)
실패한 자가 마음의 틀을 한번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심기(心機)는 마음(心)의 틀(機)이다. 일전(一轉) 한번(一) 바꾼다(轉)는 뜻이다.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마음의 틀을 한번 뒤집어서 새롭게 시작할 때 외치는 말이다. 마음의 틀을 바닥부터 뒤흔들어 한 번 바꿔야 새로운 방향이 보인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실패를 삭이고,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기 위하여 심기일전해야 한다. ‘지나간 일은 애써 쫓아가려 하지 마라(往者不追, 왕자불추)’, 실패도 성공의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였다. 털어낼 일은 깔끔하게 털어내고 변통의 심기일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한 해의 끝자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