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변곡점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고전
<데미안>
글. 김경집
저자. 헤르만 헤세 번역. 변학수 출판. 미래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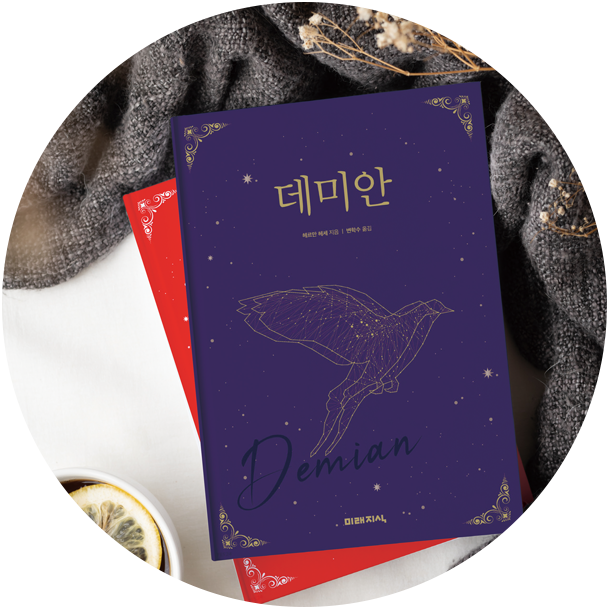
<톰 소여의 모험>을 집필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고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제목도 알고 저자도 알며 누구에게나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무도 읽지 않는 책’ 다소 풍자적 시선이 담겨있으나 뜨끔한 말이다. 고전은 의무처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삶,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대가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며 숙성시킨 문화의 결정체이다.
대가의 고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고전을 읽는 건 단순히 교양이나 지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투사시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 필독서가 아닌 자아를 찾는 필독서
필자에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해 묻는다면 청소년들에게 읽히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 필자 역시 중학교 때 처음 읽었다. 작품에 대한
이해보다 어리둥절함만 남았다. 이후 고등학생이 되어 의무감으로 다시 읽은 <데미안>은 읽었다는 만족감과 유명 구절을 인용하는 뿌듯함을 주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흔히 말하는 ‘인간 자아 성장을 향한 교과서’라는 평가에 휘둘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며 ‘미숙하게 조숙한’ 흉내를 내기에는 그만었지만 그 나이에 감당할 내용으로는
버거웠던 것이다.
주인공이 열 살 무렵부터 등장한다고 해서 청소년소설로 간주하는 건 이 책의 속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단순히 책의 명성을 좇는 판단 때문일지 모른다.
<데미안>을 다시 읽은 건 20대 후반이었다. 이미 읽었던 것이니 특별한 기대는 없었고 그저 복습하는 정도로만 대했다. 그러나 그제야 비로소 그 책의 진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라는 자문이 ‘청년 시절’ 싱클레어의 독백이라는 점에 비춰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소설은 C. G. 융의 심층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나로부터 시작해 나를 향하는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 기록인 이 소설은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자각을 일깨운다. ‘나의 인식은 에밀 싱클레어의 고뇌만큼 치열한가? 기존의 규범과 결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하고 말이다.
<데미안>,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흔히 소설의 제목이 ‘데미안’인 까닭에 주인공을 데미안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실체는 소설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신비로운 존재다. ‘남자나 어린이도 아니고,
늙거나 젊지도 않으며, 천 살쯤 되었지만 어딘지 시간을 뛰어넘은 존재’라는 서술에 걸맞다. 융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자기 자신(The Self)이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참인 존재로서의 나(眞我)’이다. 이제 예순 중턱을 넘긴 나이가 되어 다시 읽으면서 그걸 깨닫게 된다. 다시 읽는 <데미안>은 ‘나였던 그 아이’가
아니라 ‘나인 그 청년’을 새삼 발견하고, 그가 살고자 했던 삶을 나는 실현했는지 스스로 묻게 만든다. 한 권의 책이 읽는 나이에 따라 이처럼 달라질 수 있음이 바로 이
소설의 진정한 힘이다.
싱클레어의 고민처럼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세대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면 다음 세대는 그것을 누릴 환경의 모퉁이돌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데미안은 끝내 사라지지만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사라진 게 아니다. 완전히 자신 속으로 내려가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이미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있음을 발견한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겉으로의 나’와 ‘내면의 나’가 엇갈리고 외면하는 나날의 연속일지 모른다. 가끔 일치함에 안도하는 날도 있겠지만 다시 무수히
작별하다 하나로 환원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데미안>은 청소년기에 쫓기듯 잡는 간이역이 아니라 한평생 삶이 타성에 젖을 때마다 꺼내 영혼을 말리는
건조대로 삼으면 좋을 책이다.
저자 김경집은 인문학자이자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고전, 어떻게 읽을까?>, <고전에 묻다>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