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움은 어디에서 올까?
불확실성의 시대,
새로움의 뿌리를 찾아서
글. 정여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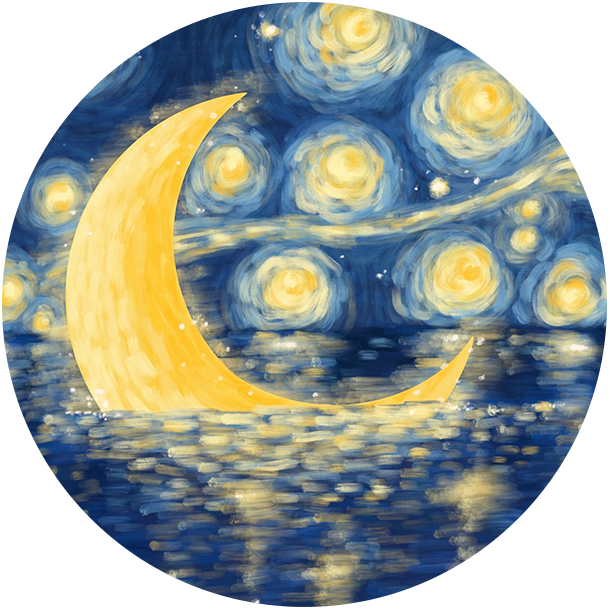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그려진 밤하늘의 경이로움, 베토벤 9번 교향곡 ‘운명’의
장엄함과 웅대함, 루시 드 몽고메리가 써내려간 주근깨 빼빼 마른 소녀 <빨간 머리 앤>의
거침없는 수다가 선사하는 감동. 위 작품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탄생한 덕분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새로운 창조에 앞서 ‘옛것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벼락처럼 날아드는 혁신은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새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나는 내 삶에 대해
어떤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별들의 풍경은 나를 꿈꾸게 한다.
새로움에도 근원이 존재한다면
빈센트 반 고흐는 들라크루아, 밀레, 렘브란트 등 과거의 화가들의 그림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모사하며 자신만의 새로움을 창조하려 애썼다. 베토벤은 모차르트를 비롯한 수많은
당대의 천재들뿐 아니라 과거의 유구한 음악의 역사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창조적 영감을 끌어냈다.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200년 가까이 사랑을 받고 있는 <빨간 머리
앤>의 작가 루시 드 몽고메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학소녀로서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옛것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자신의 삶’과 ‘오늘의 고통’에 뿌리내리려는 노력이야말로 창조적 발견자들의 공통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끊임없이
‘차별화’를 외치는 현대사회에서는 진정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졌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사람들의 한탄 또한
더욱 빈번해졌다. 정보의 홍수를 넘어 정보의 해일로 향하는 시대, 새로움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도전 앞에 겁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응원
필자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공통점은 바로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연결하려는 공감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느끼는 절박함’을 타인 또한
느낄 것이라고 믿는 것, 나아가 타인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마치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이야말로 ‘공감’이 가져다주는 매일매일의 기적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도전을 앞둘 때 미리부터 겁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는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창조적 에너지를 끌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우울증과 발작 속에서도 <별이 빛나는 밤에>와 <해바라기>라는 걸작을 쏟아냈고,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심각한
장애를 딛고 9번 교향곡 ‘합창’뿐만 아니라 후기의 위대한 곡들을 작곡해냈다. 트라우마와 콤플렉스 속에서 오히려 창조적 에너지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자의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아닐까.

데이미언 셔젤
Damien Chazelle
우리 어디쯤 있는거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라라랜드>
트라우마를 뛰어 넘어 발현한 창조성
<라라랜드>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이끈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데이미언 셔젤 역시 콤플렉스를 창조적 에너지로 발현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29세에 장편 데뷔작
<위플래쉬>로 극찬을 받으면서 일약 주목받는 감독으로 떠올랐다. 뒤이어 2016년 발표한 <라라랜드>가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1985년 컴퓨터 과학 교수인 아버지와 역사학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이미언은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다. 학장시절 그는 재즈 밴드의 드러머를 꿈꾸며
음악에 전념했지만 ‘재능이 없다’는 스승의 혹평에 상처 받아 음악을 그만두고 만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트라우마로 남았을 이 사건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가혹할
만큼 학생의 재능을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이는 <위플래쉬>의 냉혹하고도 가차 없는 스승 플레쳐 교수의 캐릭터가 태어난 것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탄생한 새로움
음악가의 꿈을 접고 하버드대에 진학한 데이미언은 일생의 벗을 만난다. 하버드대 기숙사 룸메이트이자 평생의 벗, 바로 <라라랜드>와 <위플래쉬>의 OST
음악을 만든 뛰어난 아티스트 저스틴 허위츠다.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영화를 만드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데이미언은 친구 저스틴을 통해 잃어버린 음악의 꿈도 함께 되찾게
된다. 데이미언에게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창조하는 재능은 부족했지만 음악가의 재능을 알아보는 능력, 즉 ‘듣는 귀’가 있었던 것이다.
<위플래쉬>, <라라랜드>, <퍼스트 맨> 등 데이미언의 대표작들이 가진 공통점은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타오르는 열정과
아직 인정받지 못한 재능에 대한 따스한 시선이다. 데이미언 감독 자신이 바로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꿈을 이루고 싶은 젊은 아티스트의 모델이 아니었을까.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재능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았고, 무명의 신인이라 인정받지 못해 제작비를 구하지 못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상처와 실패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트라우마로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길어 올린 데이미언의 투지는 실로 경이롭다.

헬렌 켈러
Helen Keller
내가 가진 감각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는 무엇인가가 나의 세계다.
-헬렌 켈러
어둠이 짙어질수록 선명해지는 빛을 찾길
부디 나쁜 일만 생긴다고 속상해 하지 말자.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의 영감이 싹튼다. 트라우마와 콤플렉스, 스트레스와 온갖 힘겨운 상황 속에서 비로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일들은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 결핍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창조적 영감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가 아무런 결핍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그녀의 열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고통을 그저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승화'함으로써 자신을 구하고, 나아가 고통 받는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지 않았을까. 모든 '결핍'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위대함과 창조성은 잉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정여울은 KBS 제1라디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학이 필요한 시간>,
<내가 사랑한 유럽TOP10>,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집필했다.